어머니의 볶음밥
오늘 아버지를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모시고 갔다.
어머니는 토요일 아침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것이 보기가 그랬는데
보온병에 볶음밥과 후식으로 배를 아버지 통해서 전해주셨다.
김치와 햄이 들어간
익숙한 맛의 어머니 표 볶음밥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이 것을 못먹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떤 기분일까
그 날이 언젠간 올 것이므로 마음이 안좋았다.
오늘 아버지를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모시고 갔다.
어머니는 토요일 아침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것이 보기가 그랬는데
보온병에 볶음밥과 후식으로 배를 아버지 통해서 전해주셨다.
김치와 햄이 들어간
익숙한 맛의 어머니 표 볶음밥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이 것을 못먹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떤 기분일까
그 날이 언젠간 올 것이므로 마음이 안좋았다.
요즘 들어 유튜브 활용시간이 좀 늘어났다.
차 운전하면서
유튜브로 짧은 강의나 책 요약(소개)를 듣기도 한다.
오늘은 집 PC가 7년만에 고장나서
새로이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알아보았는데
다나와에서 판매하는 PC케이스 수십개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소개하는 동영상도 있더라.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신기했다”.
예전에는 리뷰글이나 커뮤니티의 문답으로 PC케이스의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는 육성과 영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전한다.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교보문고 강남점과 알라딘 중고서점을 들렀다.
눈에 가는 책을 닥치는대로 집어서 스윽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매일 되도않은 일들에 신경쓰고 몰두하다가
잠시나마 일을 놓고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듣고 보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토~일요일에는 주로 신논현역에 있는 패스트파이브에서 일을 한다.
아무도 나를 찾거나 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들여
주중에 미처 못했거나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한다.
소송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것들은
준비서면을 쓰기도 한다.
이런 시간이 나에겐 참 소중하고 또 좋다.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강남역 주변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아 활기가 있고 옛날 생각도 나서 좋은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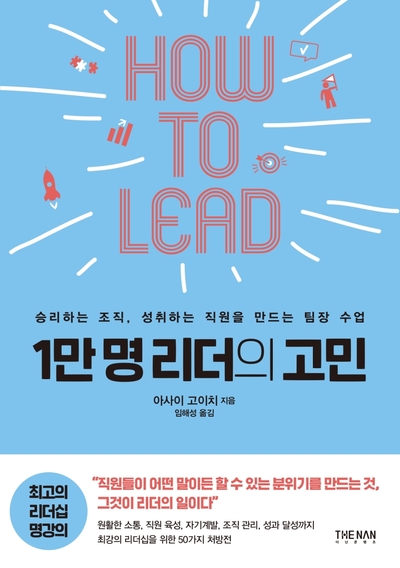
교보문고를 오랜만에 배회하다가
책 한권을 집어서 후루룩 읽어보았는데
내용들이 나에게 참 뼈아픈 내용들이다.
나는 회사를 만들었고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 배운 것, 경험, 일의 방식은 모두 월급쟁이일 때 습득한 것이고
나는 여전히 난 쌩초보 리더이자 쌩초보 사장일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하는데
아직 나에겐 쉽지 않다.
책을 읽어보고 싶다.
책은 보통 온라인에서 사는데
오래전에는 yes24를 쓰다가
지금은 99% 확률로 인터넷교보문고로 주문한다.
교보문고 오프라인 서점을 종종 가는 입장에서
책 구경만 하고 정작 거기서 책을 안사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보문고도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것으로 안다)
교보문고의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

금요일 오후 저녁 약속 전에
오랜만에 서울 강남구 공기(?)쐬고 싶어서
압구정역 부근 거리를 걷다가
멀리서 육중한 SUV가 다가오는게 보였다.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보다도 보기 힘든
롤스로이스의 컬리넌이었다.
그 차는 어느 갤러리 앞에 서더니
운전석에서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운전석에서,
유치원을 다닐 것 같은 딸이 뒷좌석에서 내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고 이런게 아니라
한달에 3-40만원되는 장기렌트카 비용이 부담되어
연말에 장기렌트카 계약 종료 후 갱신하지 않을 것을 고민하는 나를 생각하니
잠시 자괴감이 들었다.

박용만 회장이 처음으로 책을 내셨다.
신문 기사를 보고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니
초판본은 친필 사인이 있다 해서 주저하지않고 샀다.
컨설팅회사의 햇병아리이던 지금으로부터 15년반 전인 2005년 가을,
컨설팅 수고 했다면서 팀 멤버 4-5명이서 회장님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점심을 마친 후 두산타워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던 모습이 기억 난다.
본인의 생각이 담기고 또 직접 쓴 문장이 살아있는 책을 사보는건
(출판사에서 손도 안댔다고 한다)
당연하고 또 예의라 생각한다.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s을 오랜만에 들었다.
이 곡을 들으면 첫 전주에서 울컥하게 된다.
이 곡을 들었던 순간이 기억나는 장소는
예전 직장에서 점심을 먹었던
롯데 애비뉴엘 10층인가의 타니였다.
곡 자체는 제목과 달리 케이만 아일랜드와 큰 관계는 없는 곡이지만
언젠가 케이만을 가게 되면 거기서 듣고 싶은 곡이다.
패스트파이브는 토/일요일만 이용이 가능해서
설 당일과 설 다음날인 어제(금)는 집 근처 토즈 스터디룸을 이용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왠 남자가 내 앞을 막아서더니
‘어제부터 지켜봤는데 한숨쉬지말라’고 하는거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래, 내가 한숨을 크게 쉬는 습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긴 “숨도 쉬어서는 안되는 독서실”이 아니라 개방된 스터디룸이고
노트북 타자도 가능한 공간인데
한숨을 크게 쉬지 말라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편하시면 독서실을 가시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인듯 한데
그렇게 소음이 신경쓰이면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에
주변에서 민원인이나 직장 상사가 말 걸거나 소리내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새해 첫 날부터 기분이 나빴다.
최근 어느 스타트업이 2조원에 매각되었고
60%의 지분을 가진 창업자 3명이 1.2조의 벼락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그 매각 소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묘했다.
“라떼는 말이야”를 말하고 싶진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리라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회사는 매출이 인격인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팔았든 상관없이
그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성공/실패의 결론은 내려진다.
내가 지금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고자 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이 떳떳해지는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성과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허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