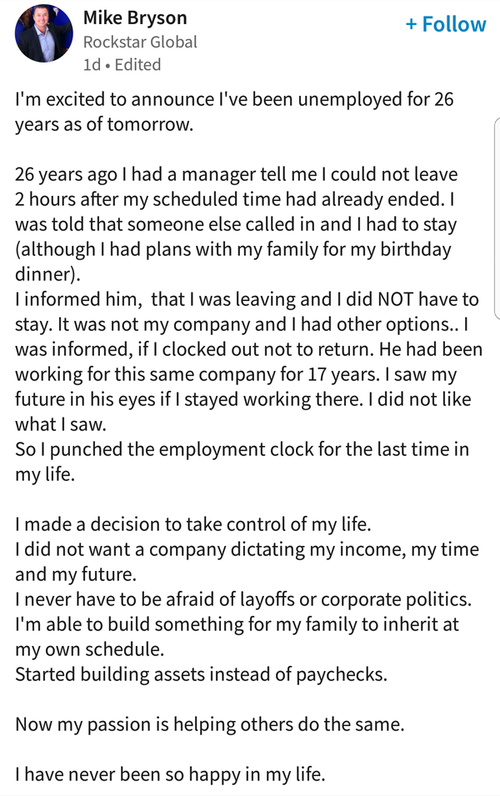한국 제조업의 소리 없는 침몰
하나둘 아닌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GDP가 전분기대비 낮아진 것도 2008년 이후로 처음이라 하니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일까?
현재 실물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다. 작년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직전 3분기 성장률이 ‘지나치게’(1.5%) 높았으니 4분기에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직전 분기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사례는 2008년 4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놀라는 것이다.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라는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주로 제조업 성장률이 전기 대비 2% 감소했기 때문이었고 제조업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제조업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나 감소했다. 분기별 제조업 생산이 5%나 감소한 적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1985년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제조업 생산 부진은 한두 업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은 24개 중분류 업종 중 22개 업종에서 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자동차(―25.2%) 가구(―23.5%) 의복·모피(―15.7%) 금속가공(―13.5%) 등 11개 업종은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19.3%)과 통신·방송장비(12.8%) 등 두 업종에서 활기를 띠었으나 대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 분위기는 매우 차가운 셈이다.
그 결과 4분기 평균 제조업 가동률은 70.9로 떨어졌다. 이 수치 역시 외환위기 당시의 65∼68나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66.5를 제외하면 1980∼1981년의 65∼67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실 평균 제조업 가동률의 하락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초부터 7년 동안 예외 없이 꾸준히 낮아졌다. 2011년 81.3에서 시작해 2012년 78.5, 2013년 76.5, 2014년 76.1, 2015년 74.5, 2016년 72.6, 그리고 2017년 4분기에 70.9까지 떨어졌다. 한 해도 반전 없이 한 방향으로 추락한 것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설비투자와 국내기계수주의 위축이 따라온다. 실제 2017년 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9%에 그쳤다. 3분기 20.6%에 비하면 매우 크게 하락했다. 국내기계수주도 4.7% 증가에 그쳤다. 3분기 31.8%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니 새로운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설비투자가 없으니 국내기계수주가 사라지고 그러니 공장 가동률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올 1월 제조업 업황 BSI가 생산이 부진했던 작년 12월(81)보다도 더 떨어진 77을 기록했다. 총 23개 중분류 제조업 중에서 16개 업종의 1월 업황이 나빠졌다고 조사됐다. 특히 석유정제·코크스업은 79에서 55로 떨어졌고 자동차업은 70에서 59로 떨어졌다. 지난해 생산이 활발했던 전자영상통신장비업마저도 업황 BSI가 101에서 93으로 하락했다. 비금속광물(75→62), 목재·나무(73→56), 가구(75→65)도 마찬가지다.
이제 증상은 분명하다. 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보루다. 싫든 좋든 제조업 성장 없이는 한국의 성장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독일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제조업 아니었던가.
작년 12월 27일에 나온 ‘2018 경제정책방향’으로는 부족하다. 3대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인 혁신성장의 내용도 이곳저곳 혁신이라는 말만 붙였지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예컨대 ‘기존산업 혁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꼭지 아래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현황과 미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1분기까지 마련하겠다’라든가 ‘주요 산업별로 업황·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미래 어법식의 대책은 전혀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7년째 생산과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설비투자가 눈에 띄게 추락하는데 언제까지 ‘대책을 앞으로 수립하겠다’고만 할 것인가.
신세돈 객원논설위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