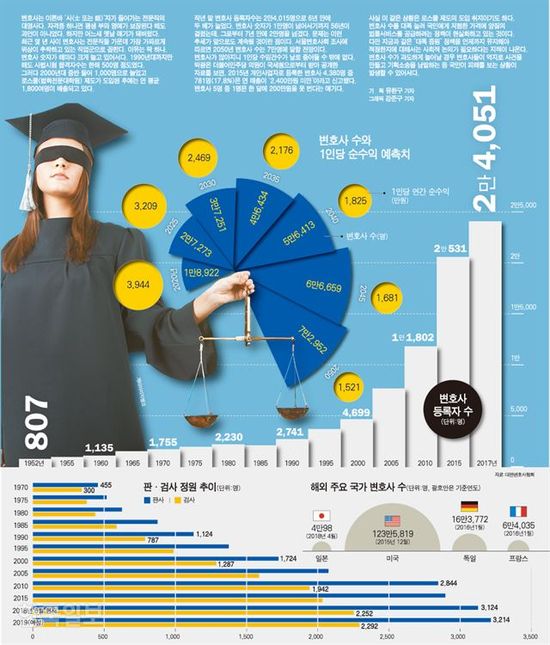기억하기 위해 적는 오늘
사업장들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현장 관리자가 나에게 전화하여
자기를 의심하는거냐, 범법자로 보는거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참담한 기분이었다.
주변분들에게 조언도 구해봤다.
경험이 많은 어느 분이 조언해주셨다.
“여기서 멈추면 밀립니다”
그렇다 어차피 각오한 일이다.
마음쓰기보다.
결연히 앞으로 나아가아지.
오늘까지만 우울해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다시 뚜벅뚜벅 걸어나가자.
하지만 오늘은 꼭 기억하리라.
2018년 7월 마지막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