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이모부
어머니 댁에 빵 드리려 들렀다가
강원도 동해시에 사시는 큰이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일 아침 부산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동해시로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가
동해시에서 다시 부산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다.
큰이모부는 항상 나를 아껴주셨고
어렸을 때 용돈도 주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해외있다고 대충 둘러대도 된다 하셧지만,
난 마땅히 찾아가 마지막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
어머니 댁에 빵 드리려 들렀다가
강원도 동해시에 사시는 큰이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일 아침 부산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동해시로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가
동해시에서 다시 부산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다.
큰이모부는 항상 나를 아껴주셨고
어렸을 때 용돈도 주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해외있다고 대충 둘러대도 된다 하셧지만,
난 마땅히 찾아가 마지막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

신격호 회장이 며칠전 세상을 떠났다.
신격호 회장의 모습을 딱 한번 본 적 있다.
광화문에서 일하던 시절 평일 저녁에 롯데 에비뉴엘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려했는데
조금 늦게 입장하던 차였다.
노신사가 주변 경호원 한두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걷고 있었고
신격호 회장의 공식 사진은 언제나 오래전에 촬영된 근엄하게 웃고있는 모습 뿐이었지만
구부정하게 걷는 그가 신 회장임을 알아보았다. 사진과 달리 많이 노쇠해보였다.
아닌게 아니라 모퉁이를 지키고 있던 경호원은 ‘회장님 지나가십니다’라고 무전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80대 후반이었을텐데 현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말 레전드 중의 레전드
그리고 저평가 받는 기업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거화취실” (신격호 명예회장 집무실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귀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배제하고 내실을 지향한다’는 의미. 신 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도 혼자 서류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등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몸에서 열이 나면 병이 나고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기업에 있어서 차입금은 우리 몸의 열과 같습니다. 과다한 차입금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무차입 경영 원칙을 고수해왔음. 롯데는 무차입 경영 원칙 덕에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상권은 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나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부지는 당초 유수지였고 인근에는 참외밭밖에 없었음. 잠실점 건립 당시 임직원들이 배후 상권이 없어 장사가 안될 것을 걱정하자 신 명예회장은 이 말을 강조하며 “2년 안에 명동만큼 번화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가는 호텔, 그것은 롯데를 말한다” (1998년 3월 24일 롯데호텔의 경영방침에 대해 장성원 당시 롯데호텔 사장에게 내린 방침)
▲ “대단히 부끄럽고 슬픈 일이며 이번 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 드려 송구하다” (1999년 3월 10일 부친 유해 도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후 다시 한번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서 귀국하는 길에)
▲ “국내 1위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기업 롯데’를 염두에 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05년 1월 25일 신년사)
▲”롯데는 어느 기업보다 앞서 현장에 있는 고객의 뜻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동료로부터, 협력회사로부터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라” (2006년 1월 9일 신년사)
▲”새로운 돌파구는 현장에서 마련한다는 각오로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는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추진돼야 한다” (2008년 12월 31일 신년사)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라는 브랜드가 `믿음을 주고’, ‘창조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이미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2009년 12월 30일 신년사)
▲ “축적해 온 핵심역량을 심화하고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갈 때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2010년 12월 31일 신년사)
▲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1월 2일 신년사)
▲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이곳이 시민들이 사랑하고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도록 하라” (2015년 5월 22일,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찾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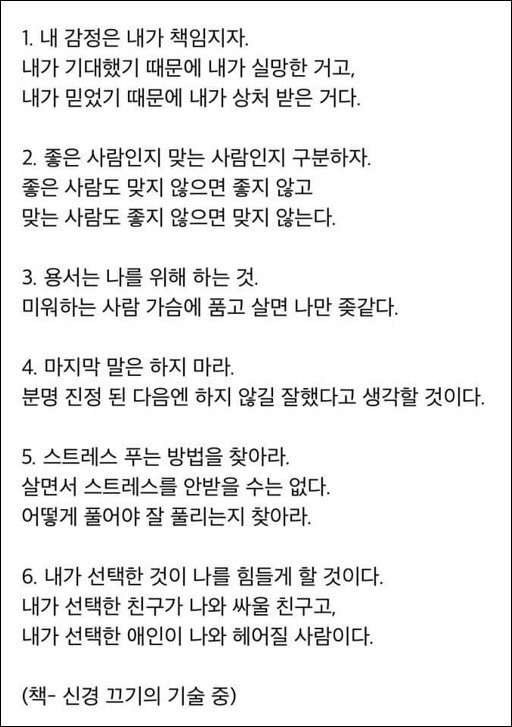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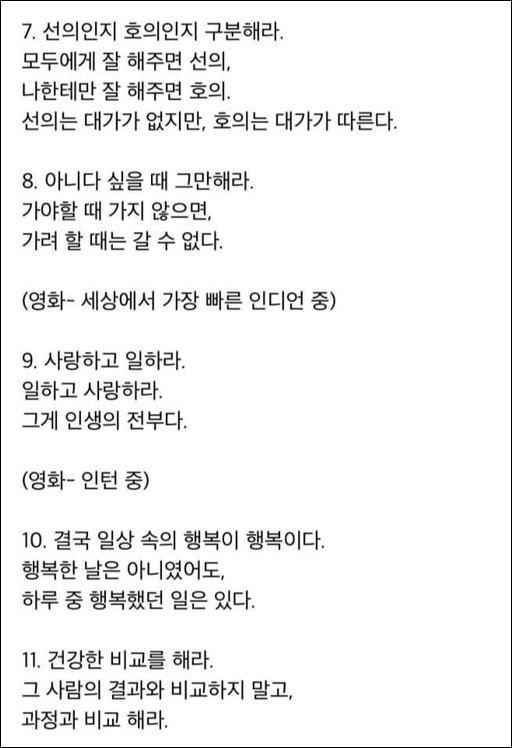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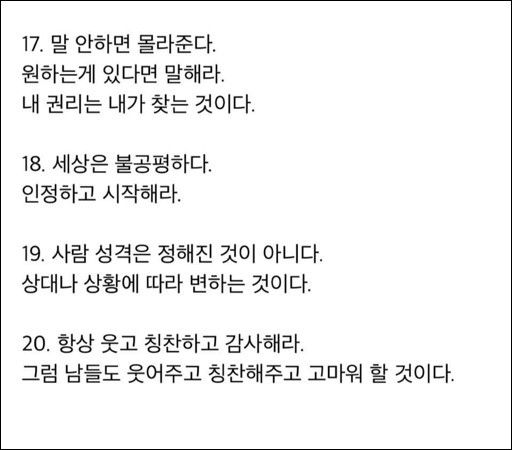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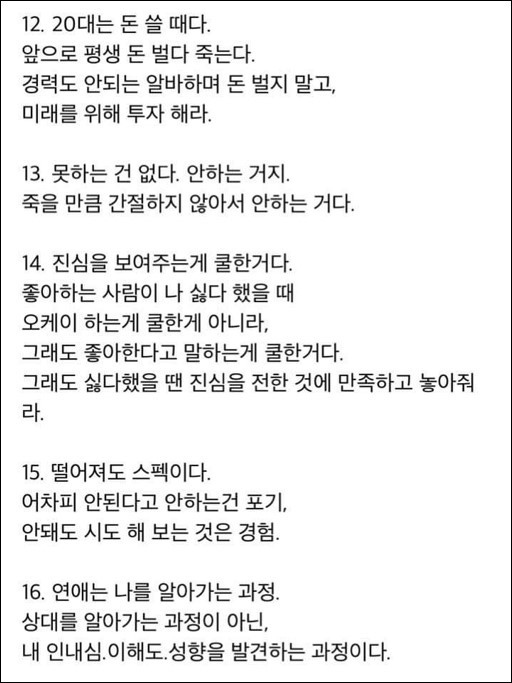
재미있고 음미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옮겨왔다.
보너스항공권을 써서 비지니스클래스로 뉴욕을 다녀왔다.
뉴욕까지 왕복 26시간을 그래도 나름 편하게 다녀왔다 생각했는데
여행의 피로도 때문인지 시차적응 때문인지
하루정도를 하염없이 잠만 잤다.
체력의 문제인지
시차는 원래 이렇게 극복하는 것인지
하루에 1만5천~2만보를 걷고
가서 몸살로 고생하다보니
대략 2kg정도 체중이 줄어있다.
뉴욕을 아내와 9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아내에게는 2번째 뉴욕이었다.
몇번째 오는 뉴욕인지 잘 모르겠다.
나에겐 큰 감흥은 없었고
아무래도 옆에 누가 있다보니 걸으면서도 계속 대화를 해야했고
여행의 장점인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매우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
한국과 시차가 14시간 정도 있어서
회사 직원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
예상과 달리 부산에는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도 했다.
언젠가 회사가 안정이 되어 remote하게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대는 비슷한 나라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날 때 천천히 읽어보아야겠다.
It takes four good things to overcome one bad thing
So says a provocative study of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
The Power of Bad. By John Tierney and Roy F. Baumeister. Penguin Press; 336 pages; $28. Allen Lane; £20.
Apoor first impression, it is widely acknowledged, counts for more than a good one. Memories that resurface suddenly tend to be unpleasant. Professional fearmongers draw a larger, more receptive audience than purveyors of restrained analysis. It is normal for people to dwell on a word of criticism for much longer than they luxuriate in a shower of praise.
For Roy Baumeister, a social psychologist, and John Tierney, a journalist, these are symptoms of “the power of bad”. Their provocative book explores what they characterise as “the universal tendency for negative events and emotions to affect us more strongly than positive ones”. Their examples make for uncomfortable reading. “One moment of parental neglect can lead to decades of angst and therapy,” they write chasteningly, “but no one spends adulthood fixated on that wonderful day at the zoo.” Other claims are dispiriting: “Successful marriages are defined not by improvement but by avoiding decline.”
Yet the authors are shrewd about the ways in which negativity can pollute both intimate relationships and large groups. They also show that bad experiences can be instructive, using stories to humanise a subject that could otherwise be dry. One concerns Felix Baumgartner (pictured), a skydiver who spent years masking his anxieties, which multiplied as he stubbornly projected an air of confidence. They only burst forth when he was in final rehearsals for an attempt to leap from a balloon 24 miles (39km) above Earth.
As they examine how Mr Baumgartner and others reverse morbid patterns of thought, the authors set out a rule of thumb: “It takes four good things to overcome one bad thing.” Accordingly, they are less keen on accentuating life’s positives than on trying to muffle its negatives. In part that means reframing adversity, like wounded soldiers who view injury “not as something that shattered their plans but as something that started them on a new path”. On a more parochial note, they advise that people who have to deal with rude customers finish every encounter, no matter how bruising, with a positive gesture—and that if you are likely to be on the receiving end of reviews, you should get a friend to summarise them, to avoid direct exposure to indelibly hurtful phrases.
A few of the authors’ tips are bland: keep to a minimum your dealings with any colleague who is clearly a bad apple, “make time for nostalgia” and in dark moments try repeating the analgesic phrase, “This too shall pass.” More often, though, their tone is challenging. They believe that higher education, after decades of enfeeblement by exaggerated anxieties about student well-being, should embrace a policy of “less carrot and more stick”. Public debate, they argue, tends to be shaped by people whose livelihood depends on amplifying the chances of catastrophe. Thus the commentariat offers rivetingly grim pieces about the risks of opioid pain-relievers, but fails to acknowledge their benefits.
At times, such judgments on supposedly overblown negativity may strike readers as a touch blasé (the authors reckon a patient’s risk of addiction to opioids is “probably less than one or two percent”). The pair are at their most bracing when, instead of lambasting the doomsayers, they extol “the upside of bad” and the power of negative experiences “to sharpen the mind and energise the will”. It has to be said, though, that some of those upsides come with titanic quantities of downside. At one point, they approvingly cite Samuel Johnson’s macabre observation that “when a man knows he is to be hanged in a fortnight, it concentrates his mind wonderfully.”
우려는 했는데 역시.
위 내시경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되어있어서
제균치료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높아졌다.
헬리코박터균은 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이해가 된다.
외부 음식을 주로 먹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단 것을 먹으며 살이 쪘기 때문이다.
정신이 번쩍 들고
서글펐다.
일이 내 몸을 망치고 있다.

사무실 회의실 유리 외벽에 240x120cm의 화이트보드를 샀다.
하도 일이 엉망진창이어서 모두가 보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샀다.
그러다보니 회의실 안에서는 화이트보드의 흉한 뒷면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진 액자를 같은 크기로 사서
유리벽 반대편에 달아서 서로를 가려주려고 한다.
고민끝에
우주 사진으로.
허블이 찍은 약 4억화소 짜리 사진이라
볼만하겠다.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살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딱 하나다.
이 정권과 정치인들의 멍청한 짓거리를
지켜보고 분노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울화가 터질 것 같다.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게 낫다.
분노해봐야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할 수 없이 인터넷과 판례 검색해도 답이 잘 안나올 때에는
무료/유료 변호사 상담을 해보곤 한다.
그런데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로스쿨 나온 변호사 (모두가 그러리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잘 모르면서 엉뚱한 답을 하여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로스쿨에서 법률가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건가 싶기도 하고.
변호사의 수는 많아졌지만
나같은 일반인이 보아도 질적 하락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것이 로스쿨 설립 취지는 아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럴거면 그냥 사법고시 합격자를 늘리지 그랬어.